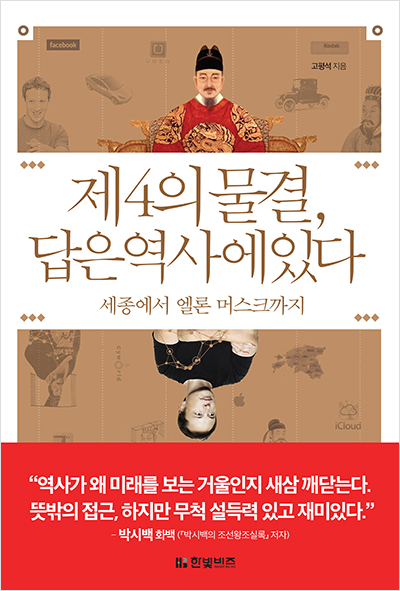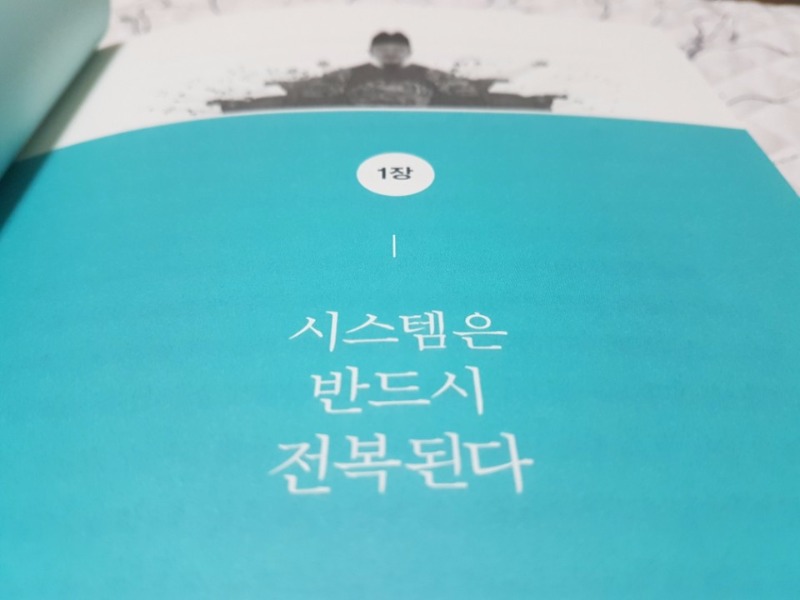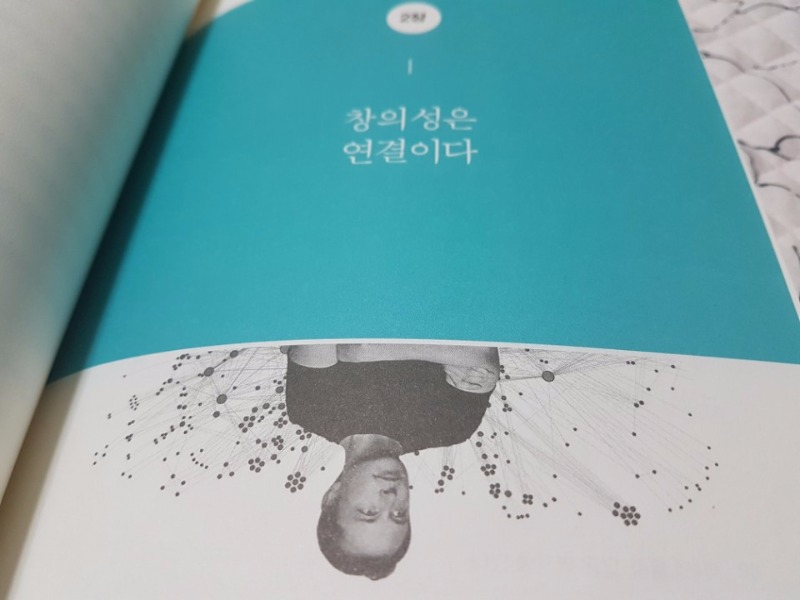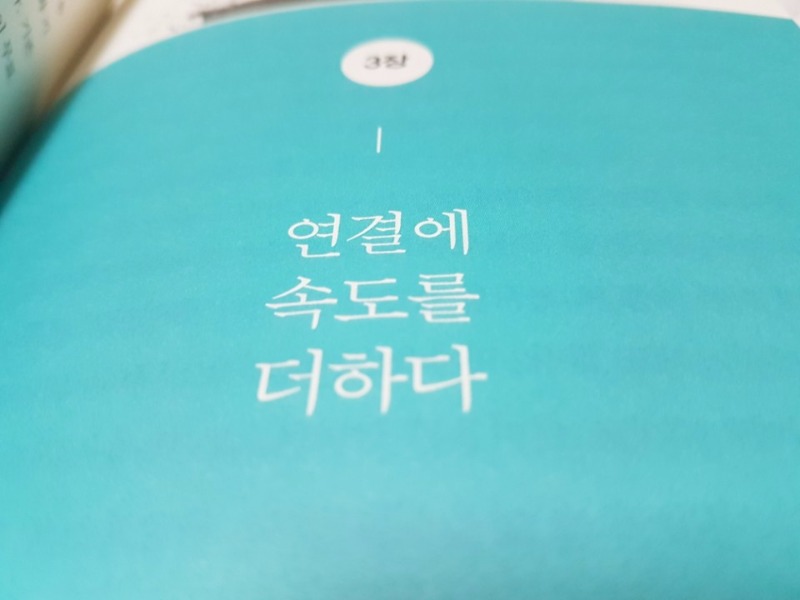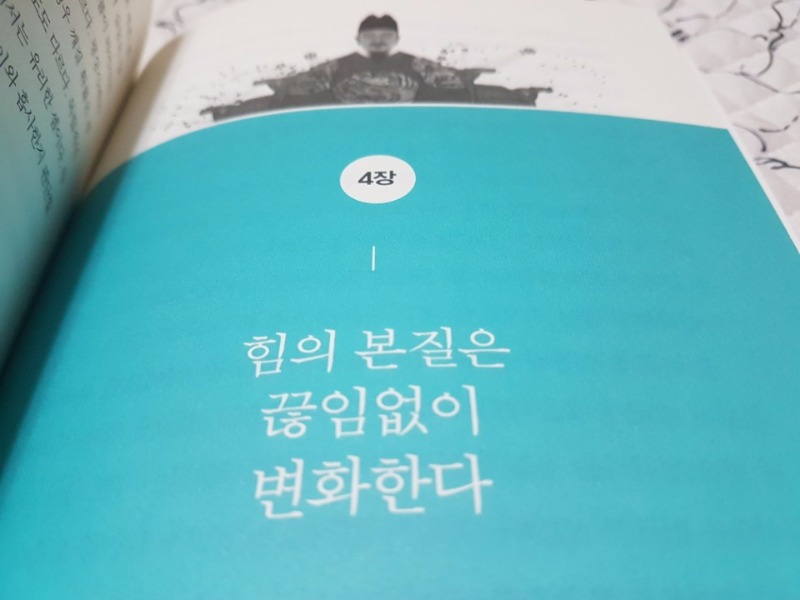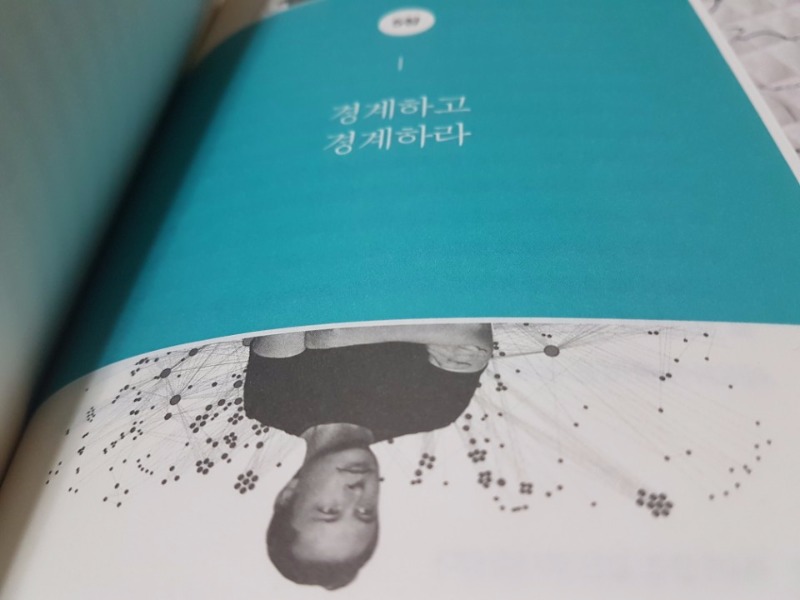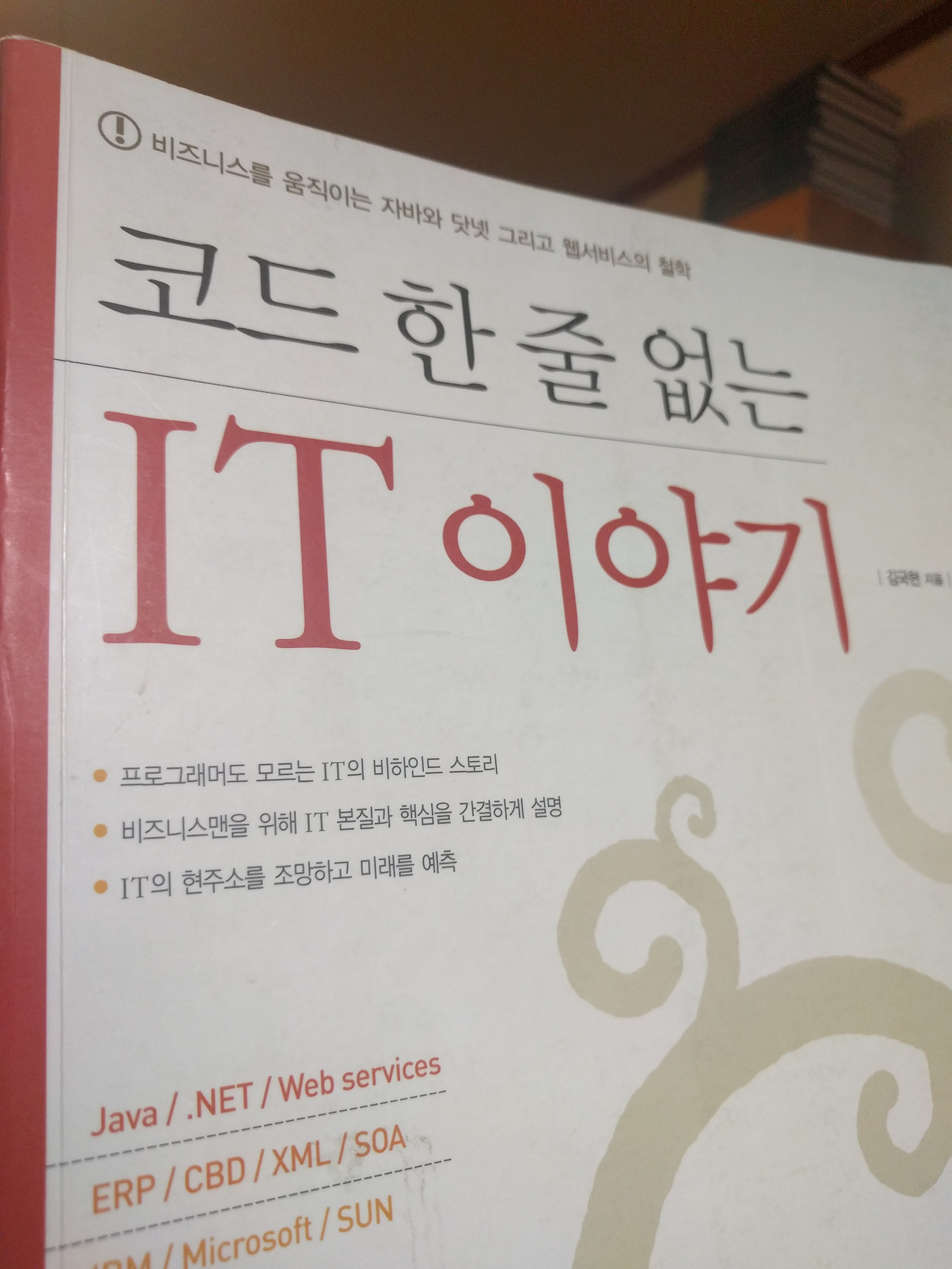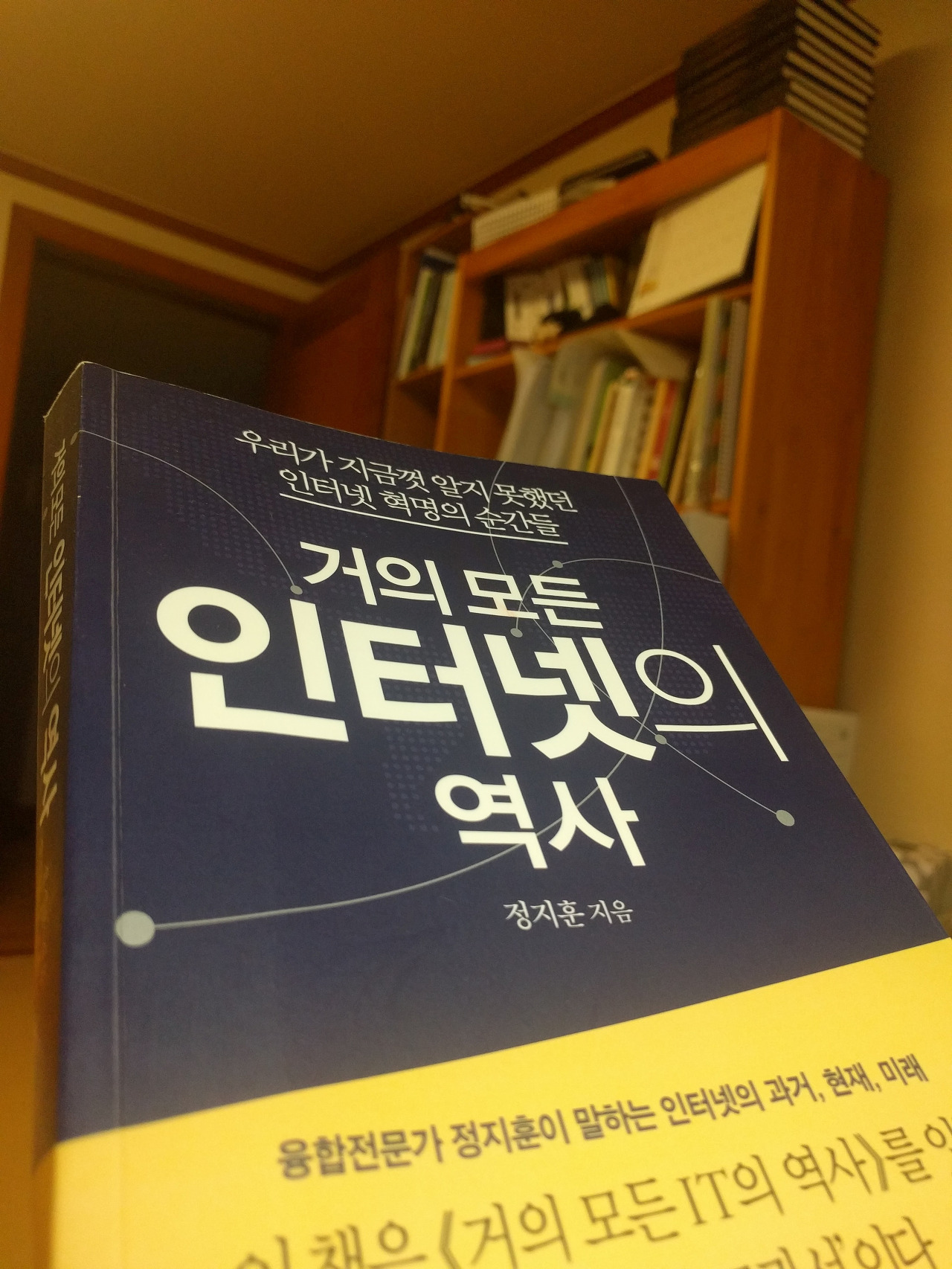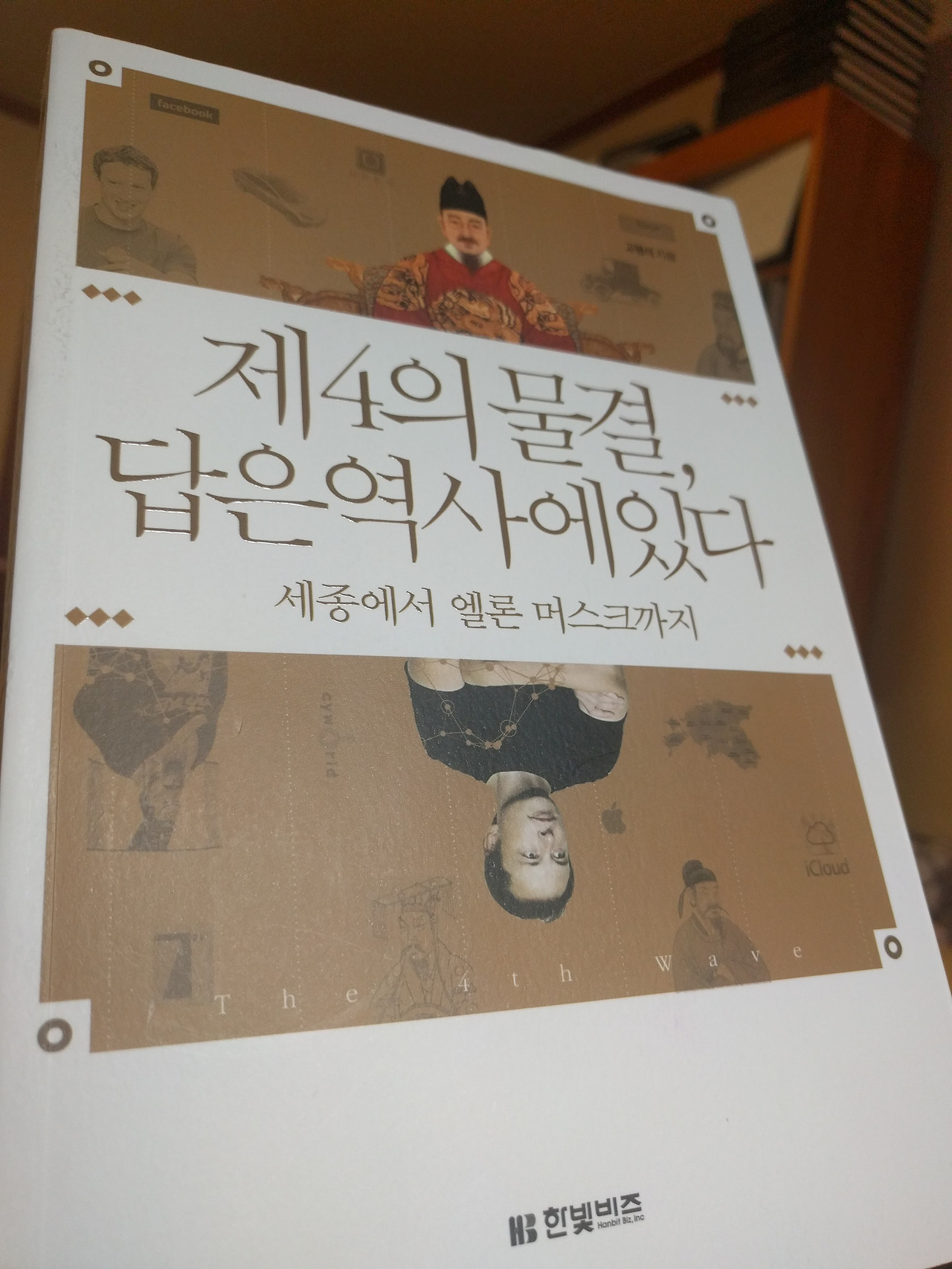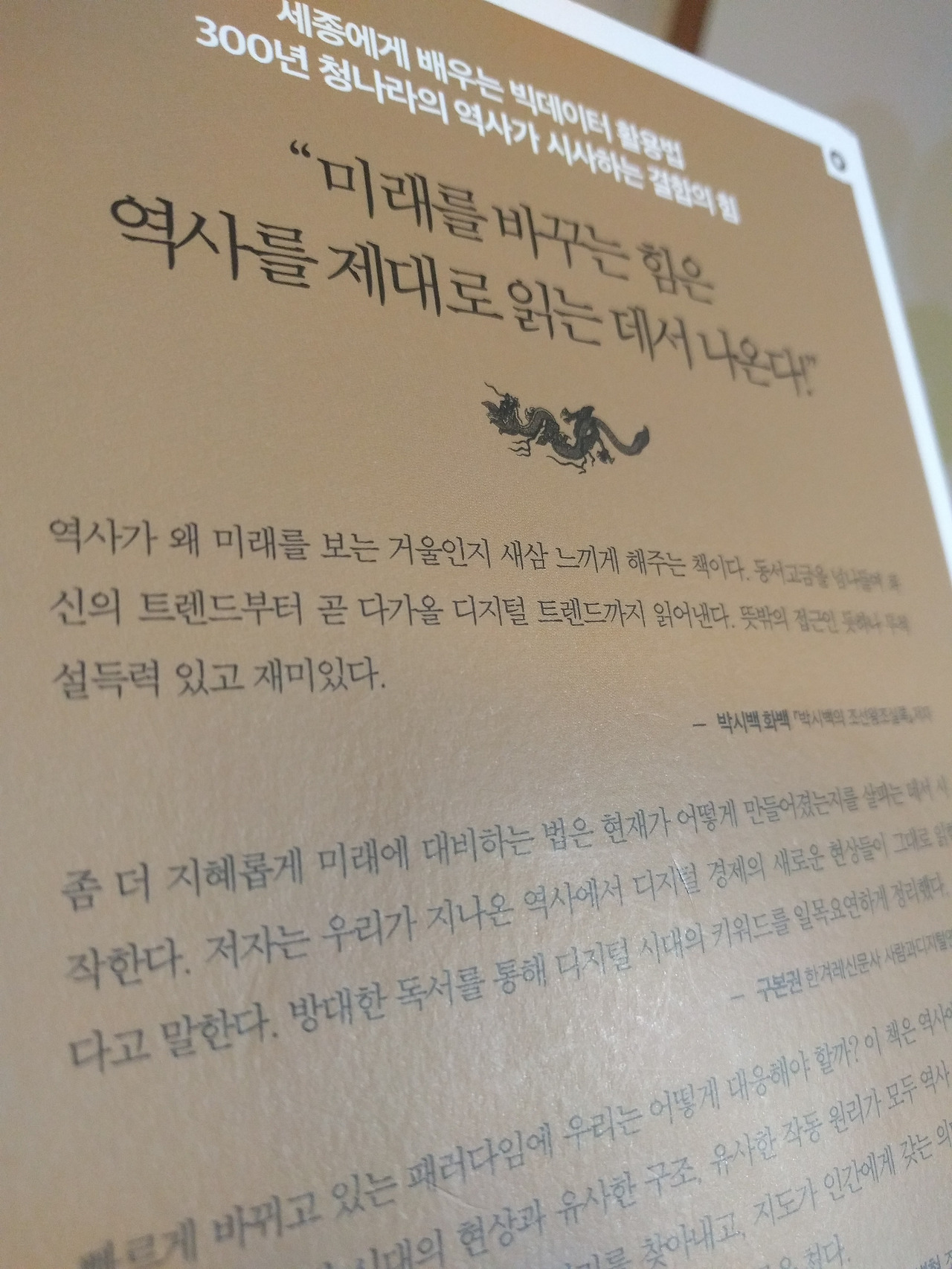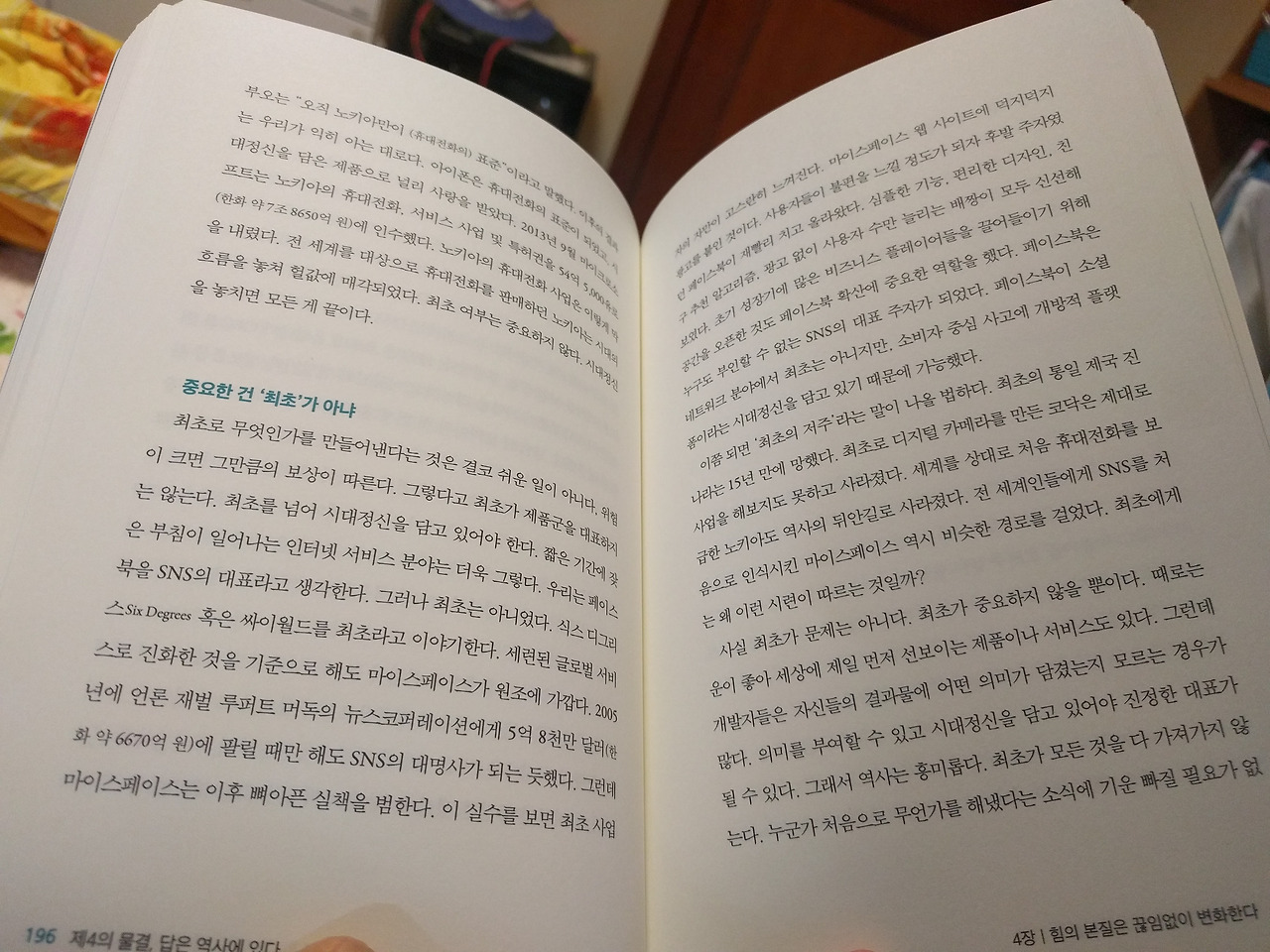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화두다. 대게 컴퓨터, 인공지능, 자동화와 같은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앞으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뭔가 마법같은 일처럼 느껴지며, 이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타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다. 이 단어는 수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작년에는 다보스포럼에도 등장한 말이긴 하지만 아직 그 뜻과 영역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며, 쓰는 사람들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바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급격한 증대를 일컫는다. 증기기관, 기차, 방적기 등의 기계장치의 등장으로 공장 생산체제가 가능하게 된 사건이 1차 산업혁명이고, 컨베이어 벨트의 등장으로 작업이 표준화되고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 2차 산업혁명이며,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저도의 로봇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3차 산업혁명이라한다. 그렇다면 요즈음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점에서 생산성의 증대와 밀접하며, 어떻게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점에서 3차 산업혁명과 비교되며, 그 맥락이 유사하다. 3차 산업혁명이 반복되는 육체노동을 대체하였던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은 반복되는 정신노동을 대체하려고 한다. 무엇이 대체될 것인지 어디까지 대체될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AI는 바둑과 퀴즈쇼를 제패하고 운전을 하며 심지어 시를 쓰고 작곡을 하며 그림을 그린다. 노동력의 대체는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는 생존의 질문이 되었다.
이 책은 그 답이 역사에 있다고 과감히 주장한다. 저자는 IT 업계의 몇가지 사례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몇몇 사건을 재미있게 들려주며, 제 4의 물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어야하고 과거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며 새로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야한다고 얘기한다. 저자의 대안은 다섯 챕터로 나뉘어 제시되는데, 첫번째 챕터는 시스템은 전복되기 마련이니 변화에 적응해야한다고 얘기하고, 두번째 챕터는 창의성을 가지라 얘기하며, 세번째 챕터는 데이터와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며, 마지막 챕터는 신뢰와 안정에 대해 말한다. 각각의 챕터는 서희가 외교담판을 지었던 이야기, 세종대왕의 토지제도와 같은 과거 이야기에서부터, 싸이월드, 간편결제, 카카오톡과 같은 최근의 일들이 저자의 시각으로 해석되어 뒷받침된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인문 역사와 디지털 트렌드를 하나로 엮어 통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그럴싸해보이는 엮음에는 의뭉스러운 구석이 많으며, 통찰은 새롭지 않으며, 제시하는 '답'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책은 역사의 전방위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으며, 역사의 자취에서 통찰을 끌어내려하지 않는다. '답'은 역사에서 끌어내진 것이 아니다. 책은 편하게 쓰여졌다. 4의 물결에 대안이 됨 직한 답을 몇개 정해두고, 그에 맞는 사례로 몇몇 역사적 사건들을 취사선택하여 늘어놓았을 뿐이다. 이 책에 쓰인 역사는 역사로서 쓰이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바일 페이’니 ‘핀테크’니 하는 용어들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지불 수단이 하나 더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발명된 세계 최초의 지폐 ‘교자(交子)’도 당시에는 놀랄 만한 신기술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새로울 수 있지만, 패러다임의 변환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좋은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만으로도 놀라운 케이스 스터디가 가능합니다. 인과관계를 따져 보기에도 좋습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디지털 기술 앞에서 기가 눌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책에는 민족주의적인 격려도 보인다. '싸이월드 도토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핀테크 DNA를 가졌으며, 세종대왕의 치정을 보면 느낄 수 있듯이 우리에겐 빅데이터 DNA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4의 물결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는 말은 그 반대로 쓰일수도 있다.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에 밀린 것으로 보아 우리에겐 세계화의 DNA가 없으며, 조선의 망국은 우리에게 변화의 DNA가 없음을 반증한다.' 각 사례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편택되었으며, 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전혀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민족적 DNA 얘기는 글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크게 해친다.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는 아직 완숙되지 않았다. 새로운 사회의 테제는 아직 자리잡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도래할 미래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설레하기도 한다. 그런 혼란과 미숙의 상황에서 이 책은 그래도 나름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경계를 하며 읽긴 해야겠지만 읽어봄직한 사례들을 발굴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